[어린이처럼 -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빛낼 작품이라길래 기대가 컸다. 개봉일을 손꼽으며 평소 습관과는 달리 개봉하자마자 영화관을 찾았다. 전작에 비해 이야기 재미는 늘어났지만 고전이 될 만큼 뛰어나 보이지는 않았다. 엄청난 관객 수와 최고라는 평이 무색했다.
이야기는 확실히 재미있어졌다. 타임워프(Time Warp, 시간왜곡)와 영혼 체인지라는, 대중문화의 두 코드를 잘 맞물리며 익숙한 듯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거기에 남녀 청소년 주인공의 로맨스가 일본 전통문화의 인연, 운명론과 어우러지니 보는 이들의 가슴을 들뜨게 할 만하다.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게 만드는, 곳곳에서 흔들리는 섬세하고 여린 빛의 이미지도 여전했다. 하지만 전작 '별을 쫓는 아이',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에서, 쉽게 포착되지는 않아도 거대하게 다가오던 상상력은 찾을 수 없었다. 서사의 대중성을 선택한 결과가 조금 아쉬웠다.

가장 문제적인 건 남녀 청소년의 영혼이 뒤바뀌는 경험을 그리는 감독의 시선이다. 도쿄의 남고생 타키와 산간 지방 이토모리의 여고생 미츠하는 일주일에 몇 번씩 서로 영혼이 바뀌어 타키는 미츠하의 몸으로, 미츠하는 타키의 몸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이들의 성격은 털털하고 진취적인 남학생,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여학생으로 전형적이다. 둘의 영혼이 바뀔 때 평소와 달라지는 말투와 태도 역시 그 성격에 따른다. 이때 관객들은 원래의 둘을 볼 때에도, 영혼이 바뀐 둘을 볼 때에도 편견이 내재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잣대를 거둘 수가 없게 된다. 영혼이 바뀐 둘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그 잣대를 들이대야만 하는 것이다.
또 미츠하의 몸은 12세 관람가로는 낯 뜨거울 만큼 종종 선정적인 시선으로 그려진다. 영혼이 뒤바뀐 타키가, 매일 아침 자신의 영혼이 미츠하의 몸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는 미츠하의 가슴을 주무르는 것이다. 미츠하의 손이 미츠하의 가슴을 주무른다 해도 그 장면은 엄연한 성폭력의 시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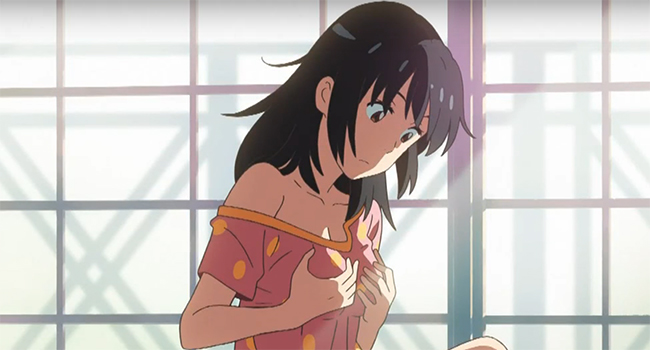
게다가 미츠하는 전근대적인 산간 마을에서 신사를 지키는 무녀 가계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미츠하가 염원하는 자아상이 바로 도쿄의 꽃미남, 타키라는 점도 문제적이다. 미츠하는 자신의 운명을 불만스러워 하면서도 순종적으로 운명에 따라 살아간다. 결국 미츠하의 운명과 생사는, 죽은 미츠하를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미츠하의 몸을 빌어 미츠하의 죽음을 막아 낸 타키에게 달려 있었다. 물론 미츠하의 도쿄 방문이 타키의 기억을 되살리기는 했지만 그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던 마음의 결과일 뿐 자기 운명에 대한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모색은 아니었다.
이런 거슬림과 불편함에도 영화에 마음이 닿을 수 있었던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이었다. 혜성 운석 충돌로 이토모리 마을이 전멸하고 미츠하가 죽은 걸 알게 된 타키가 이를 막기 위해 충돌 이전으로 타임리프(Time Leap 시간 건너뛰기)하고.... 미츠하와 친구들이 운석 충돌을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력소를 폭파한 뒤 대피 방송을 하고.... 아이들이 벌인 일을 알게 된 관청이 상황을 파악 중이니 대피하지 말고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정정할 때.... 평범한 집의 다다미방에서 방송을 들으며 두려워하고 있는 가족을 부감 쇼트(High Angle Shot)로 비추는 장면에서 난데없이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다. 타키와 미츠하가 왜인지 모르겠다며 눈물방울을 떨구던 것처럼.

그러고 보면 이미 그 이전부터 내게 이 영화는 로맨스의 감정선을 벗어나 있었다. 타키와 미츠하가 분화구의 둥그런 가장자리를 달리며 다른 시간에 있는 서로의 존재를 애타게 찾는 장면에서 나는 사랑하고 또 잃었던 나의 사람들과 더불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가 잃은 아이들이 간절했다. 영혼을 체인지한 타키와 미츠하는 ‘내 안의 너, 네 안의 나’를 찾는 운명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었지만 내가 결코 놓치고 싶지 않던 끈, ‘무수비’는 바닷물 속의 아이들과, 나를 존재하게 하는 내 주위의 무수한 존재들이었다.
타키와 미츠하는 서로의 이름을 기억해야 만날 수 있다고 믿으며 서로의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주려고 한다. 미츠하가 이름을 적기 전, 기적을 일으킨 황혼의 짧은 시간은 끝나고 타키가 미츠하의 손바닥에 적은 건 이름이 아닌 좋아한다는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꼬이고 엉키고 풀리고 이어지는 시간의 매듭을 지나 결국, 만난다. ‘잊고 싶지 않은, 잊으면 안 되는’ 이름을 기억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그 이름을 만나야 할 마음들이 있다.
 | ||
김유진(가타리나)
동시인. 아동문학평론가. 아동문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에서 글쓰기를 강의한다. 동시집 “뽀뽀의 힘”을 냈다. 그전에는 <가톨릭신문> 기자였고 서강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곳에서 아동문학과 신앙의 두 여정이 잘 만나길 바란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